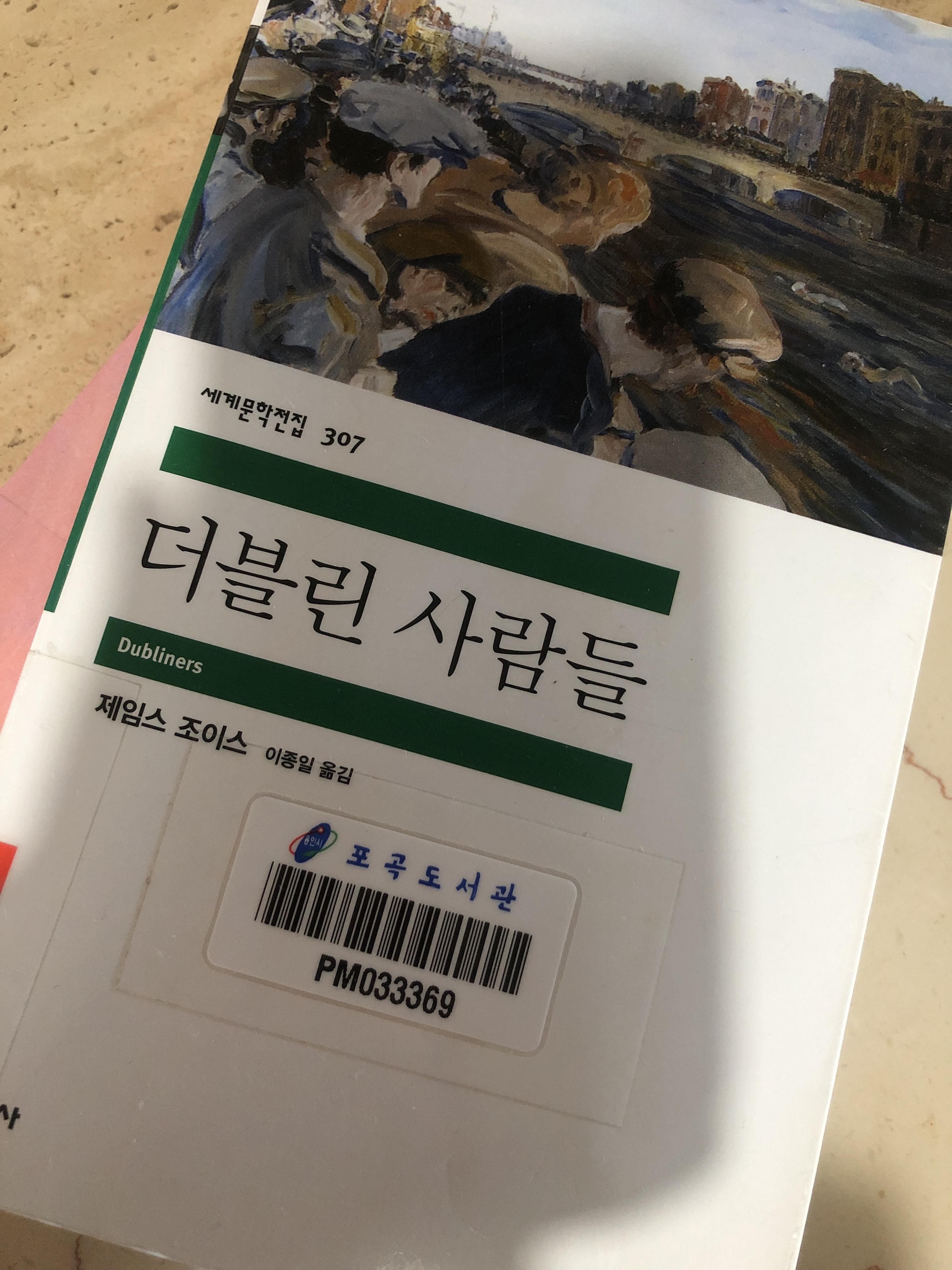제임스 조이스라는 작가가 1914년 6월에 출간한 더블린 사람들은 총 15편의 단편들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장막을 여는듯 서로 연결되지 않는듯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서서히 화자가 유년기부터 청년기, 성년기, 공존생활 등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20세기 아일랜드의 실상을 더블린이라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낱낱이 보여준다. 즉,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오랜 세월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살았다 하는데, 그 오랜 식민지 생활로 인해 더블린사람들은 피폐한 삶을 사는 것으로 그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마비" 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작품 하나하나에서 어둡고 무기력하고 타락한 모습들로 서로 연결시켜 하나의 커다란 마비(사전적 의미에서 신경이나 근육이 형태의 변화없이 기능을 잃어버리는 일로 본질의 기능이 둔하여지거나 정지되는 일)라는 주제를 이야기 해 주고 있는데 일반적은 독자인 난 책의 끝부분에 있는 작품 해설이 없었다면 도통 단편 하나 하나를 의미있게 받아드리지 못 하고 단순하게 읽기만 했을듯 하다. 그만큼 작가가 이야기 하고 싶어한 인간의 내면의식을 깨우치는 일, 더블린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싶다. 또한 20세기의 아일랜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없을 듯 하다. 그져 막연하게 오랜 영국의 식민지 생활로 인해서 깨어나고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깨우치지 못 하고 현실에 안주한 것은 아닐까? 아님 노력하고 노력해도 자신들의 주체성과 정체성이 변화할 수 없었던 것일까? 아는만큼 보인다고 제대로 의식하고 깨우치는 눈으로 보면 다시금 무엇을 이야기하려 한 것인지 조금 알듯 하지만, 어찌 되었던 내겐 어러운 소설이었으며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고전독서모임이 아니었다면 어쩜 이런 의식적인 생각도 하지 못 했을 듯 싶다.